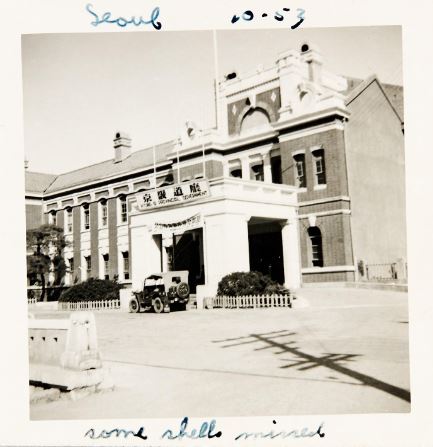목록전체 글 (210)
일상 역사
 덕수궁 석조전에서 일식 먹고 찍은 고종 가족 사진
덕수궁 석조전에서 일식 먹고 찍은 고종 가족 사진
20세기 전후 아시아의 군주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사진 찍기를 싫어했던 사람과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사람.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자신의 왜소한 체격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많지 않다. 반면 대한제국 고종의 경우, 사진에 호의적이었던 것 같다. 무당을 신뢰해 왕실 재정으로 궁궐 곁에 관우 사당도 차려주고, 눈 밖에 난 신하는 외국까지 자객을 보내 암살하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 또 시신을 갖고 오게 해서 팔도에 뿌렸던 임금이었으나 커피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기호만큼은 참으로 '모던'했다. 그래서 그런지 사진도 꽤 많다. 역사 기록물로서 사진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찍었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옛 신문을 보다가 고종의 가족사진 가운..
 순정효황후, 친일 단체, 애국금차회에 기부하다
순정효황후, 친일 단체, 애국금차회에 기부하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병참 지원을 위해 조선의 자원을 탈탈 털어내기 시작했다. 이때 조선의 개명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총후銃後(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결성한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다. 금차는 금비녀를 말하는데, 마치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금비녀를 모아 전쟁 비용에 보태자는 취지에서 만든 단체다. 중일전쟁 발발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1937년 7월 말 경기여고보에서 결성했다. 이날 바로 김복수金福綏 회장은 금비녀 십 수 개를 들고 용산 조선군사령부로 찾아가 경성요지방위사령관 후카자와 도모히코(深沢友彦)중장에게 헌납식을 거행했고, 이를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 당시 명성 있던 화가 김은호金殷鎬를 불러 그림으로 남겼다. 이것이 훗날 김은호의 대표작이자 ..
 주취 여경, 독직폭행을 주장하다
주취 여경, 독직폭행을 주장하다
[사건요지] 1. 강동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순경 A씨가 술에 취해 3월 7일 새벽 1시 22분경 성남 중원구 모 아파트 정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 신고를 받은 성남중원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출동했다. 3. 만취해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B 등(?)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4.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B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A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5. 강동경찰서는 소속 경찰인 A를 대기발령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6. 강동경찰서 A는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B를 독직폭행으로 신고했다. 7. 신고를 접수한 성남중원경찰서는 독직폭행은 동일 서에서 수사할 수 없어 인근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2022년 강북경찰서 경찰관 2명이 60대 남성을 집 문앞까지만 데려다 ..
 남로당 이강국, 고유섭의 죽음을 애도하다
남로당 이강국, 고유섭의 죽음을 애도하다
현대일보 1946년 7월 12일자에 실린 기사다. 글을 쓴 이강국李康國(1906~1956?)은 양주 출신으로 1925년 보성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고유섭도 보성고등학교 졸업 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지낸 시간만큼이나 친분도 돈독했던 듯하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재학 중 공산주의 이론에 입문하고 1928년 중퇴해 베를린 훔볼트 대학 법철학과에 입학, 독일 공산당에도 가입해 활동했다. 귀국 후 파업을 주동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등에 참여 좌익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미군정 하에서 체포령이 떨어지자 월북했다.(이때 연인 김수임이 도움을 주었다.) 북한에서 외무국장, 조선인민군병원장, 조쏘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
 친일파의 징표, 한국병합기념장
친일파의 징표, 한국병합기념장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피탈한 뒤로 여러 기념 행위를 이어갔다.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병합기념장은 1912년 3월 28일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한국병합기념장은 단순한 기념 메달이 아니라 "한국병합"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훈장이었다. 칙령이 반포되자 담당부서인 일본 내각 상훈국償勳局에서는 기념장의 디자인을 발표하고 제작에 착수했다. 지난달(3월) 28일 칙령으로써 한국병합기념장 제정의 건을 발표하였는데, 이 기장은 위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황동원형에 직경 1촌으로 상부에는 국수문(국화무늬)이오, 양측에는 오동 및 오얏의 꽃가지를 넣고 (또) 중앙 홍색 좌우 황색, 백색의 테두리가 있는 띠(綬)를 달았다. 이 기장은 한국 병합의 사업에 관여한 ..
 바다의 왕자 의친왕,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넘겨주다
바다의 왕자 의친왕,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넘겨주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할 때 제일의 부자는 왕실이었다. 왕실은 역둔토며 전국의 산림수택을 소유했다. 군함 하나 사는 데도 낑낑거렸던 대한국이었지만 이권이 있는 곳에는 황실이 있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황족 또는 왕족 가운데 어장 소유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선의 의화군, 대한제국의 의친왕, 일제강점기의 이강공, 즉 이강李堈이다.고종, 바다가 자기 것이라며 왕자에게 주다통영군 연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민 3,268명은 연명하여 이영재, 옥치기, 이주목, 김종혁, 황치종 등을 대표자로 해서 이강공 전하 소유의 어장(漁區)개방 청원을 총독부와 이강공저李堈公邸에 제출하였는데, 그 일에 대해 혹 이강공저 사무관 구로자키(黒崎) 이강공저 사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강공 저하 소유의 어장에 ..
 금화초등학교, 중군영, 청수관, 천연정
금화초등학교, 중군영, 청수관, 천연정
서대문구 천연동의 금화초등학교 앞에는 3개의 표석이 있다. 하나는 중군영 터, 하나는 천연정 터, 하나는 청수관 터다. 표석 세 개만으로도 이곳에 많은 이야기가 서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연못이 있던 자리금화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본디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모화관 남쪽에 연못을 조성하라는 조선 태종의 지시에 따라 1408년에 판 것이다. 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지西池’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이 외에도 남대문 밖의 남지南池, 동대문 밖의 동지東池가 있었는데, 모두 연꽃이 만발했다. 그래서 그 해 어느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는가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지의 연꽃이 활짝 피면 서인이, 남지의 연꽃이 활짝 피면 남인이 득세했다는. 또 ‘반송지..
 자격루보다 오래된 물시계
자격루보다 오래된 물시계
'물시계'라고 하면 세종 때 만든 조선시대의 자격루를 떠올릴 것이다. 물을 흘러내려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 물시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낮에는 해로 시간을 측정하면 되지만 해마저 잠든 밤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간의簡儀나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같은 일종의 별시계도 있었지만 잠 안 자고 내내 별을 관측하며 시간을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밤의 시간은 대체로 물시계에 의존했다. 초기의 물시계는 통 밑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물시계에 샐 '루漏' 자를 쓰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중국에는 한대漢代 간단한 물시계인 누기漏器가 실물로 남아 있다.(원통형 금속 용기 아래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 자격루처럼 여러 통을 두고 마지막 통에 부표를 넣어 떠오르게 하는 방식의 물시계는..
 (동영상) 직박구리, 종달새인줄
(동영상) 직박구리, 종달새인줄
직박구리는 참새목 직박구리과 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에 서식한다. 야산이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텃새처럼 보이지만 이동하는 아이들도 있어 중국 남부 해안에서 겨울을 나기도 한다. 몸길이는 28cm 전후로 날렵한 체형을 가졌다. 깃털은 회갈색이나 회색에 가깝다. 갈색 깃털도 섞여 있지만 종달새 같은 갈색은 아니다. 머리 깃털이 올라와 있어 종달새로 착각했다. 그런데 찾아보니 종달새는 흥분했을 때만 머리 깃을 세운다고 한다. 막 자고 일어나 머리가 뜬 아이처럼 귀엽다. 잡식성으로 잠자리, 말벌, 과일, 곡식 등을 먹는다. 겁이 많아 가까이 오진 않지만 더러 공원에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먹기도 한다.(빵, 과자 이런 것들) 5~6월이 산란기로 대략 4~5개 정도 알을 낳는다. 일본어로는 ..
 당나라 관리 주자사, 신라에 오다
당나라 관리 주자사, 신라에 오다
신라와 당은 오랜 시간 사절을 주고받았다. 당시 바다를 건너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삼국사기에는 바다를 건너오다 사고를 당한 사신 이야기도 나온다. 당나라 사신 가운데 처음 이름을 올린 사람이 주자사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48년(626) 가을 7월에 당唐이 사신을 보내 조공朝貢했다. 당 고조高祖가 주자사朱子奢를 보내 고구려와 서로 화친할 것을 권유하는 조서를 내렸다." 당나라 사신들의 이름은 종종 언급되나 구당서나 신당서 열전에 입전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주자사는 유학전儒學傳에 실려있다. 이는 그만큼 동시대 그의 학문이나 글솜씨가 인정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그럼 그의 열전을 옮겨 본다. (*밑줄은 번역에 자신 없는 부분이니, 언제든지 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