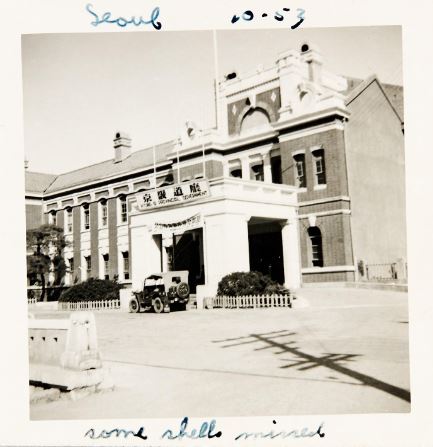목록친일파 (7)
일상 역사
 성균관 석전대제에 참석한 조선총독
성균관 석전대제에 참석한 조선총독
유학은 일제강점기에도 그 생명력을 이어나갔다. 조선 500년의 통치 이념이었으나 유학의 여러 덕목은 식민통치자들에게도 유효했다. 충성의 대상, 즉 임금만 바꾸면 이보다 좋은 이데올로기도 없었다. 유학은 사무라이의 교양이기도 했기에 그들에게도 익숙했다. 1915년 3월 17일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수하를 이끌고 석전대제 참석했다. 이하는 그 신문기사다. 석전 거행, 데라우치 총독 참배 2월 17일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경학원經學院에서 춘기 문묘文廟의 석전대제釋奠大祭를 거행하였는데 이날은 즉 중춘仲春의 상정일上丁日이라. 융융한 화기는 반궁泮宮에 가득하고 생기가 그치지 않는 춘풍은 묘정에 불어와 명륜당明倫堂 앞의 화훼교목에는 호생지덕好生之德이 나타나니 혼연한 덕기德氣가 초목에 미치는 듯하더라..
 친일파 유생 송종수, 조선총독을 환영하다
친일파 유생 송종수, 조선총독을 환영하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자 그 틈에 한 몫 잡아보겠다는 자들도 상당했다. 과거에는 명함 한 장 없던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유생 대표"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기도 했으니, 그 대표가 이 아래 나오는 송종수(1841生, 서대문 밖 홍파동 866번지 거주)라는 자다. 1911년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이 조선에 부임하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환영사를 써서 총독부 돈으로 일본 유람도 다녀왔다. 훗날 1920년에는 순종에게 삼년복상을 해야한다는 상소를 올리고도 했고(매일신보 1920.1.21.), 1922년에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받든다며 "부자교父子敎"라는 신흥종교를 창시해 사람들로부터 교비를 갈취했다.(동아일보 1922.10.4.) 세상의 일변에 친일행위를 한 자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먼 훗날 유림의 ..
 순종의 유조, 끝까지 찌질했던 대한제국 융희 황제
순종의 유조, 끝까지 찌질했던 대한제국 융희 황제
충신 조정구, 순종 황제의 유언을 전하다 1926년 4월 25일 대한제국 황제를 하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내준 순종 황제가 사망했다. 몇 달 뒤인 1926년 7월 8일 미국의 한국어 신문 신한민보에는 순종의 유조가 올라왔다. 이 유조는 전 궁내부 대신인 조정구趙鼎九(1860~1926)가 받아 전한 것이라 한다. 조정구는 대한제국 시대 고관을 역임하여 국권 피탈 후 일제는 그에게 남작 작위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넙죽 받은 덕수궁 이태왕 이하 그 가족과는 달랐다.) 그는 승려로 입적하는 등 평생 피해 살았으며 중국으로 망명해 임시정부에도 참여했다.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다 순종이 죽기 1달 전, 신문이 발생되기 3개월 여 전인 1926년 3월 30일에 사망했다. 따라서 유조의 진위는 검증을 요한다. 여하튼..
 순종 황제의 굴욕, 일본 황태자를 모시다
순종 황제의 굴욕, 일본 황태자를 모시다
조선왕실, 대한제국황실 가족들은 나라를 잃고도 호의호식했다. 이들은 일본황실의 왕공족으로 대우받았다. 달라진 것은 다스릴 나라, 부려 먹을 백성이 사라졌을 뿐이다. 예전 교과서에는 대한제국의 멸망을 ‘한일합방’이라고 표현했으나, 이제는 ‘국권피탈’이라고 쓴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도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합방’이라는 단어도 가려서 쓴 것이니 당시에는 ‘일한병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른 바 '일한병합'을 기념하여 일본은 여러 가지 기념물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쇄물이었다. 사진첩, 팜플렛, 엽서 등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왕공족은 여기에 단골메뉴였다. 허울뿐이었던 제국 놀이는 채 20년도 유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황제 가족들은 기념물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동궁 이건 부인의 친일행적
사동궁 이건 부인의 친일행적
의친왕 이강의 적장자는 모모야마 겐이치(1909~1990)다. 옛 이름은 이건李鍵으로, 누가 시켜 개명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다. “이은 가족은 모두 조선명, 이건공은 성마저 왜놈식으로” 패망한 군국주의 일본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황족들이 이제는 일반인민들과 같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거니와 이 황족들과 같이 왕족에서 물러난 이조 왕족의 자손들의 동향 한토막. 이태왕의 삼자인 이은(52세) 해방 후 시부야에서 과자 가게를 경영하며 조선이 그리워 조선으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하였다는데 지난번에는 조선식으로 자기 처 이본궁방자(48) 아들 구와 같이 개명까지 하였다 한다. 즉 이은李垠은 은흥垠興 처는 유희兪嬉 아들은 구학玖學으로 개명을 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은의 사촌인 이건공은 성명까..
 친일파의 징표, 한국병합기념장
친일파의 징표, 한국병합기념장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피탈한 뒤로 여러 기념 행위를 이어갔다.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병합기념장은 1912년 3월 28일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한국병합기념장은 단순한 기념 메달이 아니라 "한국병합"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훈장이었다. 칙령이 반포되자 담당부서인 일본 내각 상훈국償勳局에서는 기념장의 디자인을 발표하고 제작에 착수했다. 지난달(3월) 28일 칙령으로써 한국병합기념장 제정의 건을 발표하였는데, 이 기장은 위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황동원형에 직경 1촌으로 상부에는 국수문(국화무늬)이오, 양측에는 오동 및 오얏의 꽃가지를 넣고 (또) 중앙 홍색 좌우 황색, 백색의 테두리가 있는 띠(綬)를 달았다. 이 기장은 한국 병합의 사업에 관여한 ..
 바다의 왕자 의친왕,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넘겨주다
바다의 왕자 의친왕,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넘겨주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할 때 제일의 부자는 왕실이었다. 왕실은 역둔토며 전국의 산림수택을 소유했다. 군함 하나 사는 데도 낑낑거렸던 대한국이었지만 이권이 있는 곳에는 황실이 있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황족 또는 왕족 가운데 어장 소유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선의 의화군, 대한제국의 의친왕, 일제강점기의 이강공, 즉 이강李堈이다.고종, 바다가 자기 것이라며 왕자에게 주다통영군 연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민 3,268명은 연명하여 이영재, 옥치기, 이주목, 김종혁, 황치종 등을 대표자로 해서 이강공 전하 소유의 어장(漁區)개방 청원을 총독부와 이강공저李堈公邸에 제출하였는데, 그 일에 대해 혹 이강공저 사무관 구로자키(黒崎) 이강공저 사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강공 저하 소유의 어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