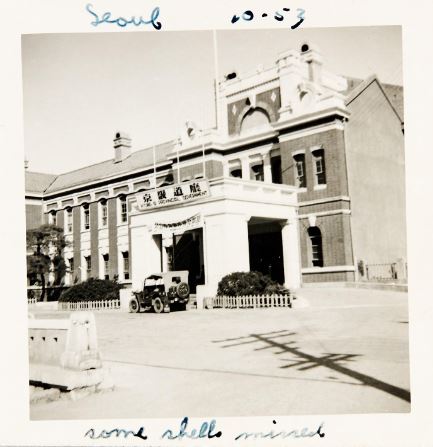목록천문 (2)
일상 역사
 자격루보다 오래된 물시계
자격루보다 오래된 물시계
'물시계'라고 하면 세종 때 만든 조선시대의 자격루를 떠올릴 것이다. 물을 흘러내려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 물시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낮에는 해로 시간을 측정하면 되지만 해마저 잠든 밤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간의簡儀나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같은 일종의 별시계도 있었지만 잠 안 자고 내내 별을 관측하며 시간을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밤의 시간은 대체로 물시계에 의존했다. 초기의 물시계는 통 밑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물시계에 샐 '루漏' 자를 쓰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중국에는 한대漢代 간단한 물시계인 누기漏器가 실물로 남아 있다.(원통형 금속 용기 아래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 자격루처럼 여러 통을 두고 마지막 통에 부표를 넣어 떠오르게 하는 방식의 물시계는..
 때에 맞춰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때에 맞춰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世宗 58卷, 14年(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12月 15日(庚子) 2번째기사 서운관에서 월식을 아뢰니, 승정원에 구식할 필요가 없음을 전지하다 ○ 書雲觀以月食啓, 傳旨承政院曰:當食而食, 古人不以爲災。 況今日月已落, 食與不食未可知, 不可以爲災, 不必救食, 如何? 安崇善等啓: “上敎至當。” 서운관에서 월식을 보고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식이 일어나는 때 식이 일어나는 것은 옛 사람들도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물며 오늘은 달이 이미 졌으므로 월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재앙이라 할 수도 없으니 식을 계산할 필요가 머 있겠는가? 어찌 생각하는가?” 안숭선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늘 생각이 들었던 문제인데, 굳이 찾아보지 않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